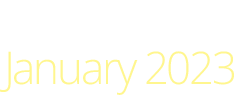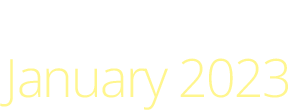나의 맥주 사랑 이야기
 0
건양대학교병원 인승민
0
건양대학교병원 인승민

필자는 원래 술을 잘 못먹어서 독한 술, 소주보다는 맥주를 좋아하는 편이었다. 맥주라면 카스와 하이트, 그리고 쏘맥 밖에 모르던 내게 10여년전 처음 학회 차 들른 독일에서 맛본 밀맥주(바이젠 비어)는 나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그 당시 아무리 맥주에 문외한이라도 보리로 맥주를 만드는 것은 알았지만, 밀로 맥주를 만들면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구나 하면서 감탄한 기억이 엊그제 같다. 그 길로 독일 맥주에 빠지게 되었고, 현재 어느덧 맥주 덕후 12년차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실을 십분 활용하여 틈만 나면 맥주 강대국 독일로 없던 학회도 만들어 떠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독일 뮌헨의 호프브로이 하우스 같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대중적인 맥주집을 찾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차를 렌트해서 물좋고 경치좋은 산골짜기 수도원 맥주 양조장들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바에엔슈테판 양조장(독일 프라이징, 1040년부터 맥주제조), 두번째로 오래된 발텐버그 수도원 양조장, 에탈 수도원 양조장, 안덱스 수도원 양조장 등등.. 또한 유명한 독일 맥주 브랜드들의 (바이엔슈테판, 에딩거, 파울라너, 슈무커, 아잉거, 크롬바커, 슈나이더바이스, 뢰벤브로이 등등) 양조장들을 한번씩 가보자 라는 욕심이 생겨서 독일에 갈 때마다 독일 맥주 브랜드들의 양조장 도장깨기를 시작해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1월까지 나의 맥주 투어는 계속되었다. 코로나로 아쉽게 3년간 독일을 못 가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글을 쓰고 있던 중 “뭣이 중한데!!” 라는 생각에 2023년 봄에 맥주여행을 떠나기 위해 독일 학회를 찾아내어 학회등록비를 결제하고, 바로 항공권을 예매한 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다시 글을 쓰고 있다.
필자를 맥주 덕후로 입문하게 한 밀맥주는 거품이 부드럽고 탁한 황금빛으로 쓴맛이 억제된 맥주이다. 지난 10여년간 선호하는 맥주가 여러 번 바뀌어 왔지만, 지금도 필자가 가장 즐겨 마시는 계열의 맥주는 밀맥주이다. 우리나라 술로 따지면 막걸리정도가 될 듯하다. 병으로 된 밀맥주는 투명해서 맥주를 잔에 따르다 보면 병바닥에 효모덩어리, 즉 약간 누르스름한 초록빛의 유산균 덩어리가 보인다. 맥주를 80프로 정도 따르고 남은 맥주를 따를 때, 맥주병을 휘휘 돌리면서 잔에 남은 거품과 같이 따르면 이 유산균 진액을 같이 마실 수 있는, 참 재밌는 맥주이다. 밀맥주는 과거에 서민들은 못 먹는 고급 맥주였다. 왕족이나 귀족들만 자신의 궁전 안에 밀맥주 양조장을 만들고 자기들끼리만 먹었다고 한다.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밀맥주를 서민들이 먹으면 처벌했다고 하니..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했을까. 과거 못사는 중세시대에 빵을 만들어 먹기에도 밀이 부족했기 때문에, 밀로 술을 만들게 되면 서민들이 빵은 안 먹고 술만 마시게 되서 그렇게 했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렇듯, 우리가 밀맥주를 신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먹게 된 것은 신분제가 폐지되고 평등사회 이후라고 하니,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은 각 지역마다 유명한 맥주들이 있는데, 방금 소개한 바이젠비어(밀맥주)는 뮌헨에서 가장 유명하고, 쾰른 대성당으로 유명한 쾰른에는 퀠시비어, 그 옆 뒤셀도르프에는 알트비어, 베를린에는 베를린 바이스비어, 독일의 작은 베네치아인 밤베르크에는 바비큐향이 나는 훈제맥주인 라우흐비어가 유명하다. 라우흐비어는 밤베르크의 양조장에서 직원이 졸다가 보리를 홀라당 태워서, 이걸 버리기 아까워 맥주를 만들어보니, 훈제향이 나고 의외로 맛이 있어서 탄생하게 된 재밌는 일화를 가진 맥주인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밤베르크의 초록색 건물로 유명한 맥주집 쉬렝케를라에서 라우흐비어를 꼭 먹어보기를 추천한다. (사진1 참조)

사진1. 독일 밤베르크의 쉬렝케를라 양조장(좌), 훈제맥주를 먹다 우연히 합석한 술자리(우)
흔히 와인은 신의 축복, 맥주는 신의 선물, 액체빵이라고 하는데, 독일사람들의 맥주 사랑은 참 각별한 것 같다. 낮에 비어가르텐이라는 야외 맥주 정원에서 식사하며 가볍게 맥주한잔 하는 것이 일상이며, 퇴근 후에도 집 근처의 맥주집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야외에서 맥주 먹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필자가 독일에 방문했던 10여년 전에는 정말 물보다 맥주 값이 더 싸서 물 대신 맥주를 숙소에 쟁여놓고 먹은 기억이 난다. 독일이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맥주 강국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1516년 바이에른 공국의 빌헬름 4세가 맥주를 만들 때 물, 보리, 홉으로만 맥주를 만들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령(맥주순수령, Reinheitsgebot)을 발표한 것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독일의 브루마스터들은 이 세가지 재료를 비율을 달리하면서 수백년 동안 맥주를 연구하면서 만들게 되고, 독일 맥주의 품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1987년에서야 유럽재판소에서 맥주순수령이 보호무역주의를 금지하는 조약에 어긋난다고 판결해서 해지되었다고 하니, 근 400년이상 맥주순수령으로 인해 맥주를 만드는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대되는 나라가 맥주 종류의 세계 최강국 벨기에이다. 맥주 종류만 무려 1,500개 이상일 정도로 벨기에인들 마저 죽기 전까지 모든 종류의 맥주를 못 먹어본다고 한다. 독일이 맥주의 정통성을 강조한다고 하면 벨기에는 맥주의 창의성, 다양성을 중시한다. 벨기에 맥주는 맥주순수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 맥주에 물, 보리, 홉 외에 오렌지 껍질, 포도, 체리, 초코렛, 커피, 고수, 백합꽃 등등의 다양한 재료를 첨가해서 맥주를 만들다보니, 다양한 맥주 종류의 최강국이 되지 않았나 싶다. 근접한 체코도 맥주이야기를 빼놓으면 서러운 나라이다.
세계에서 1인당 맥주 소비량이 최고인 나라가 바로 체코이다. 체코인들이 얼마나 맥주를 물처럼 마시는지 알 수 있는 통계이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라거는 체코의 필스너 우르켈이라는 맥주이다. 체코 플젠지방의 부드러운 연수를 사용하고, 체코산 사츠홉, 그리고 보헤미안 보리를 써서 달콤 쌉싸름한 맛이 정말 일품인 황금빛의 라거맥주이다. 체코 프라하에 학회가 있어 기차를 타고 1시간반쯤 거리의 플젠 지방의 필스터 우르켈 양조장을 가본적이 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그날이 일년에 한번 있는 필스너 우르켈 맥주 축제날이었다. 양조장 가이드 투어도 신청했는데 지하 맥주창고에 들어가 수킬로미터를 걸어서 맥주제조 과정을 견학하고, 마지막에 가이드가 내 키의 세배나 되는 거대한 캐스크(오크통)에서 맥주 한잔을 건네 주었는데 그때 먹은 맥주 한잔, 그 young beer의 맛은 정말이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신선한 향과 시원한 땅속 온도, 달콤 쌉싸름한 맛과 황금빛 색깔의 조화는, 단언컨데 내 인생 최고의 맛이었다. 지금도 그 생맥주 한잔을 먹기 위해 직항도 없는 프라하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이다.
요즘 수제맥주집에 가면 메뉴판의 맥주 리스트에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한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맥주용어에는 HEAD, 엔젤링(BEER LACING), DRAFT BEER/CRAFT BEER, ABV, IBU, SRM정도가 있다. HEAD는 맥주 따를 때 생기는 거품을 말하는 것으로 맥주의 맛, 즉 아로마를 잡아주어 맥주 맛을 보존해주며,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엔젤링은 흔히 아사히 맥주광고를 생각하는데 맥주 마신 후 잔 안쪽에 남는 맥주의 거품 고리를 말한다. 드래프트 비어는 쉬운 말로 생맥주인데, 저온살균처리가 되지 않은 신선한 맥주로 캐스크나 케그맥주를 말하며, 크래프트 비어는 소규모 양조장에서 다양한 제조양식으로 소량 생산되는 수제맥주를 말한다. ABV (Alcohol By Volume, %)는 맥주의 알코올 도수를 말한다. IBU (International Bittness unit)는 맥주의 쓴맛을 0~100까지 표현한 것으로 가장 쓴맛이 100이다. 일반적으로 라거는 10, 밀맥주는 13, 에일맥주는 40, IPA (Indian pale ale)은 50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SRM (Standard Reference Method)는 맥주의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2~40까지 표현하며 라거가 2~7정도이고, IPA는 4-12, 숫자가 오를수록 점점 색이 탁해지고 검은색으로 되며, 흑맥주는 40이라고 보면 된다. 처음 접하는 맥주가 있을 때 위의 용어들을 참고해서, Ratebeer나 Untapped라는 맥주앱을 설치하여 맥주를 검색해보면, 어떤 종류의 맥주인지 상세히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페일 에일 맥주는 Toppling Goliath Pseudo Sue라는 공룡을 형상화한 NE (New England)계열의 IPA맥주이다. 이것을 Ratebeer에 검색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나오는데(사진2 참조), 해석해보면 미국 아이오와의 시 데코라에 있는 Toppling Goliath Brewing이라는 microbrewery 회사에서 만든 맥주로 탑50안에 드는 순위가 높은 맥주이며, 평점은 전체적으로 100점, 맥주스타일은 99점, 5점만점에 4.07의 별4개 이상의 평점을 받은 훌륭한 맥주이다. 전체 리스트맥주에서 1,407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페일 에일 맥주 중에서도 NE계열의 Hazy (과일향이 풍부)한 맛의 IPA맥주임을 알 수 있다. 알콜도수가 5.8도로 도수도 좀 있고, IBU가 44이니 약간 쓴 편에 속하는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앱검색으로 이 맥주에 대해 보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맥주에 대해 평가한 리뷰 글도 볼 수 있으며, 내가 마셔보고 평가할 수도 있으니 맥주 정보를 블로그로만 뒤지는 것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Untapped에서 검색하면 Draft, Bottle, Can, Taster 맥주 인지에 따른 각각의 5점 만점의 평점도 표시되어 있어, 내가 먹을 맥주의 용기에 따라 평가된 맛도 알 수 있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요즘 괜찮은 수제맥주집에 가면 맥주 리스트에 이렇게 Ratebeer, Untapped를 참고해서 점수를 매겨놓은 메뉴판도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하다. 필자가 좋아하는 맥주스타일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했는데, 처음에 독일의 밀맥주에 빠져있다가, 페일에일을 마시고, IPA, NE IPA, Sour IPA, Stout, Imperial Stout에서 다시 밀맥주로 돌아오는 순으로 선호도가 바뀌어 갔다. Stout(흑맥주)중에서도 특히 Imperial stout는 도수가 10도 넘는 진한 흑맥주인데, 역시 술을 즐기다 보면 도수가 센 술로 가게 되는 듯하다. 한동안 미국 서부의 west coast style IPA, NE IPA에 빠져서 몇 년간 이 맥주만 마신 적이 있었다. 하지만 West coast IPA는 쓴맛에만 집중하다 보니 질리게 되어, 부드러운 쓴맛을 중시하는 호박색의 과일 향이 폭발하는 NE IPA에 빠지게 되었다. 필자가 현재 가장 좋아하는 맥주 두가지를 꼽으라면 밀맥주와 NE IPA맥주를 꼽는다.

사진2. Ratebeer에서 검색한 Toppling Goliath Pseudo Sue라는 NE IPA맥주
맥주가 가장 맛있는 용기의 순서는 캐스크(오크통), 케그, 병맥주, 캔맥주의 순서이다. 쉽게 설명하면, 캐스크 맥주는 맥주양조장이나 가야 먹을 수 있으니 패스하고, 캔맥주가 가장 휴대성이 좋고 편하지만 병맥주에 비해 신선도와 맛은 떨어진다. 케그 맥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제맥주집에 가서 마시는 생맥주가 이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 수제맥주집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생맥주를 마시고 싶으면 대형마트에 가서 케그통, 즉 5리터짜리 3- 4만원정도하는 커다란 스테인리스 맥주통을 사와 지인들을 초청한 후 실컷 마시면 된다. 필자는 맥주는 그 맥주회사의 브랜드 전용잔과 전용 코스타(맥주밑에 놓는 종이받침대)에 놓고 먹어야 보기도 좋고 가장 맛을 보존한 채로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깔맞춤이다. 보기 좋게 셋팅하고 먹으면 맛도 좋게 느껴져서 그런 듯하다. 라거, 에일, 밀맥주 모두 전용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 맥주잔은 맥주의 향, 거품, 온도가 맛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전용잔에 마시는 맥주가 가장 맛있다. 맥주는 브루어리에서 만들지만 맥주의 완성은 TAPSTER가 한다는 말이 있다. 맥주를 서빙하고 잔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전문가를 TAPSTER(Tap master)라고 하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맥주는 잔에 따를 때 잔표면에 기포가 없어야 하며, 맥주잔의 온도와 맥주의 온도는 비슷하게 맞춰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호프집에서 맥주를 주문했을 때, 갓 소독한 따뜻한 잔이 나오면 당당하게 시원한 잔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쁜 맥주잔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 잔 덕후 이기도 한데, 12년동안 독일 각지를 돌아다니며 맥주잔을 모으다 보니, 어느덧 큰 찬장 두개를 다 채우게 되었다. (사진3 참조)

사진3. 필자의 보물 1호 맥주 전용잔 찬장
맥주는 무겁게 다가가거나, 어렵게 공부해가면서 마시는 술이 아니다. 맥주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과유불급 즉, 적당히 과하지 않게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맥주를 즐기는 나름의 규칙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이다. 최고의 안주는 기름진 안주가 아닌, 헝그리 안주정신 그리고 갈증이다. 그래서 특히 여름에 퇴근 후에 맥주약속을 잡으면, 점심은 거르거나 최대한 가볍게 먹고 갈증을 유지한 채, 첫 맥주를 들이킨다. 그 한 모금을 위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며 일 하고, 낮부터 물 한 모금도 신중하게 마시고 참고 버티며, 샤워도 자제할 정도니.. 내가 생각해도 맥주에 대한 변태적 가학성은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 개인적으로 꼭 한번 마셔보라고 추천하는 인생 맥주는 두체스 드 보르고뉴라는 벨기에의 레드 에일 스타일의 맥주이다. 18개월간 오크통에서 숙성한 맥주로 거친 산미가 함께 와인 맛이 난다. 단맛에 비해 6.2도라는 비교적 높은 도수이고, 비싼 가격이지만 요즘은 대형마트에도 판매되니, 꼭 한번 마셔 보기를 추천한다.
옛말에 행복은 가까이에 있고, 진리는 단순한 것에 있다고 했다. 맥주에 대해 알아갈수록, 필자는 주변의 가장 친한 지인들, 제일 편한 사람과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시원하게 한잔 들이키는 맥주가 가장 맛있는 맥주이며, 맛있는 맥주를 고를 때, 지금까지 언급한 맥주지식들은 무시하고, 그날의 기분과 분위기에 따라 맥주를 선택하여 즐길 것이라고 말하며 이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