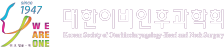카뮈와 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 거리낌없이 사랑할 권리!
 0
(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빙교수 전영수
0
(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빙교수 전영수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작가는 누구인가?” 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이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좋아하더라도 자기 가슴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대표작가 한 사람 내세운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다행히도 나는 언제나 “알베르 카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니, 나름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謹弔).’ 그것 만으로서는 아무런 뜻이 없다.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의 첫 문장이다. 이 당돌한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카뮈를 동경하게 되었다. 나는 1950년 6·25전쟁이 나던 해 작은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대구에서 하숙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때 카뮈의 소설들을 처음 읽었다. 특히 『이방인』의 파격적인 글을 읽고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소설을 써보고 싶은 큰 욕구가 생겼었다. 욕망이 크면 클수록 방황의 무게는 더 크게 느껴졌다. 문학도의 꿈을 이루고 싶어 대학교 진학만큼은 문과를 선택하고 싶었으나 당시 나의 상황은 공대로 진학할 수 밖에 없었다. 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과 불안감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가던 중, 군 입대 영장이 나왔고 군대는 내 인생의 방황의 늪을 잠시나마 피해갈 수 도피처가 되었다. 그리고 전역하면서 나는 평생 다시는 글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나는 사업차 알제리를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인천공항에서 파리 샤를 드골공항까지 12시간, 그곳에서 환승으로 짧게는 2시간 길게는 6시간을 보내고 다시 알제리의 수도 알제까지 2시간 탑승 후 최종목적지에 도착하면, 16시간에서 20시간이 걸리는 고단한 여정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학창시절 카뮈를 사랑했던 열정 때문에 알제리로 가는 길이 참 설레었다. 카뮈는 프랑스 작가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당시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태어난 작가이다. 알제리는 132년간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다가 1962년에 독립한 국가로, 국토면적이 한반도 10배쯤 되고 인구는 4,300만 명, 1인당 국내총생산은 4,000달러 정도다. 천연자원으로 광물과 석유, 천연가스가 풍부하지만 아직도 개발도상국 문턱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생전에 카뮈는 “나는 가난 속에서 자유를 배웠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러면서 그는 “노력은 항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 노력은 결코 무심하지 않으며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 준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보너스까지 더불어 가져다 준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게으름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게으름은 인간을 패배하게 만드는 주범이므로, 성공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게으름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알제리가 아직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하지 못한 것은 그가 말한 것처럼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해서 일까? 아니면 가난 속에서 자유를 늦게 얻어서 그런 것일까? 잠깐 생각해보았다.
알베르 카뮈는 통찰력 있는 작가로서 개인의 자유를 파고드는 문학들로 1957년 43세의 나이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하지만 불행히도 알제리가 독립하기 2년 전 1960년 46세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프랑스와 알제리 양쪽에서 이방인으로 지탄을 받던 카뮈는 알제리의 독립과 동시에 흔적이 철저히 지워졌다고 한다. 알제리인들 중에는 카뮈를 오히려 혐오하는 경우도 있고, 노벨문학상 수상 당시 알제리에 세워졌던 문학기념비도 이름이 지워진 채 엉망으로 보존되어 있다. 2014년 2월, 나는 모험을 해서라도 카뮈의 문학비가 있다는 티파사를 찾아가보기로 한다.
“봄철에 티파사에서는 신(神)들이 내려와 산다. 태양 속에서, 압생트의 향기 속에서, 은빛으로 철갑을 두른 바다며, 야생의 푸른 하늘, 꽃으로 뒤덮인 폐허, 돌 더미 속에 굵은 거품을 일으키며 끓는 빛 속에서 신들은 말한다.”
카뮈가 쓴 산문 “티파사에서의 결혼” 첫 시작 글이다. 이 아름답고 멋진 글을 암송하면서 신들이 내려와 산다는 티파사로 들어섰다. 이곳에서도 2월 초 새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든지 아몬드 꽃 향기가 물씬거리면서 코끝을 찌른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아몬드 꽃 향기를 마음껏 맡아 볼 수 있구나 하고 푸른 생기가 내 가슴속 깊숙이 파고 더는 것 같다. 하지만 아몬드 나무 바로 옆에는 땅을 깊고 넓게 파서 지하건축물로 만든 로마시대의 대표적 상징물인 원형경기장이 옛 모습을 잃고 썰렁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고요하게 잠들어 있다. 그곳을 지나 오른 쪽 지중해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로마 유적지 어디에서나 많이 볼 수 있는 허물어진 대리석 기둥 여러 개가 을씨년스럽게 하늘 높이 우뚝 치솟아 있고, 주변에는 크고 작은 빛 바랜 검은 황토 색깔의 직사각형 돌들이 폐허로 변한 체 여기 저기 나뒹굴면서 서로 다른 몸살을 앓고 있다. 중앙 통로는 흙 한 발자국 밟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로마시대 만들었다는 돌길이 가지런한 모습을 잃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그 돌길을 따라 300미터쯤 앞으로 나아가니 신(神)은 모두 다 어디로 갔는지 은빛 파도가 허물어진 유적지 위에까지 올라와서 넘실거린다. 언덕 길로 삼백 미터쯤 올라 갔을까? 갑자기 야산 중턱 모퉁이에 네 개의 큰 아치형 벽체가 지중해 바다를 향해 웅장하게 버티고 서있다. 허물어진 건물 일부지만 로마시대의 장엄한 위용은 사라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다. 이곳이 기독교 대교회당 바실리카가 있던 자리이고, 대교회당 광장에서 오십 미터쯤 올라가니 잘 다듬어진 검정색 석관들이 많이도 흩어져 있다. 로마시대 왕족과 귀족들 무덤이다. 삼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렇게 버려진 체 홀대를 당하고 있으니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이름 모를 노란 꽃들만 석관 한 가득 피어나 티파사의 하늘나라 신들을 바라보고 있다. 백 미터쯤 더 올라갔더니 서울 남산 높이의 정상이 나타났다. 지중해가 가장 멀리 훤하게 잘 내려다보이는 명당 중 명당이다. 그곳에 폭 50센티 높이 1미터 50센티 크기의 돌기둥 하나가 외롭게 서있다. 카뮈의 문학비다! 문학비에 “나는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그것은 거리낌 없이 사랑할 권리다.” 하고 그의 산문집 『결혼』의 한 구절이 새겨져 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카뮈가 지금까지 살아 온 내 삶에 무엇을 가르쳐주었고, 또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구나 싶었다. “은퇴하게 되면 당신이 좋아하는 소설을 다시 쓰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사진설명 : [원형경기장]
사진설명 : [원형경기장]
 사진설명 : [카뮈 문학비]
사진설명 : [카뮈 문학비]
 사진설명 : [티파사 유적지 해변]
사진설명 : [티파사 유적지 해변]
 사진설명 : [교회당 바실리카]
사진설명 : [교회당 바실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