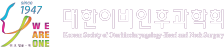Kresge Hearing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Michigan 연수기
- 유전자치료를 이용한 청각 유모세포의 재생 -
 0
전남대학교병원 이성수
0
전남대학교병원 이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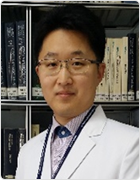
손상된 유모세포를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지는 지금까지 현대의학이 풀지 못한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임상에서 어지러움과 난청 환자들을 보면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청각 유모세포 재생에 관하여서는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세계 최초로 포유류 성체에서 청각유모세포 재생에 성공하고 이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분은 University of Michigan의 Yehoash Raphael 교수였습니다. 관심이 있던 차에 단국대병원 이민영 교수님이 최근(당시)에 이미 연수를 다녀온 것을 알게 되었고 소개 받아 ARO학회 때 Raphael교수님을 만나게 되어 연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미시간대학교에 Kresge hearing research institute라는 청각 연구센터가 있는데, 알고보니 아산병원 정종우 교수님, 서울대 오승하 교수님, 고려대 송재준 교수님, 단국대 정재윤 교수님, 충남대 박용호 교수님, 단국대 이민영 교수님이 이곳에서 연수를 하셨었습니다. 현재 Kresge Institute 학술 및 동문모임이 결성되어 있으며 제가 연수를 결정하고 나서 환송회도 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시금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미시간대학교는 미국 미시간주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에서 서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Ann Arbor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 병원은 미국 병원 탑 랭킹에 있고 특히 이비인후과는 최근 3년 미국 랭킹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훌륭한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었던 Kresge Hearing Research Institute도 1960년대 설립되어 역사가 매우 깊고 현재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청각에 관한 연구 하나에만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것은 2018년 여름. Ann Arbor가 북위 42도로 여름 기온이 한국에 비해 서늘하며 습도도 높지 않아 너무나도 쾌적한 날씨였습니다. 또한 인구 10여만명의 소도시에 대부분의 인구가 대학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수준이 높고 안전한 도시여서 가벼운 마음으로 연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실험실에서 받은 첫인상은 기존 것을 잘 유지. 보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기부를 받아 새롭고 멋진 건물들도 들어서지만 기존 건물들도 계속 고치고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에 의한 관리가 중요한 법, 그래서인지 여기도 규칙, 저기도 규칙이었습니다. 규칙이 정해지면 반드시 따르고 어기면 끝까지 찾아내서 반드시 처벌하는 문화가 낯설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융통성 있게 처리할 것도 원칙대로 하는 게 처음엔 정도 없고 서비스 정신이 낮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처음 실험실 생활 시작해서 거의 2달동안 아무 실험도 시작하지 않고 교육만 거의 20개 (일반안전, 동물실험, 바이러스 관련 교육 등등) 이수 받았습니다. 2달이 지나니 미국에서 살 집, 마트 등 생활 동선, 애들 학교도 정리되고 본격적인 연수 생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미시간대학교병원 전경. 미국 중부 대평원의 지평선과 알록달록 활엽수들이 인상적이었다.
미시간대학교병원 전경. 미국 중부 대평원의 지평선과 알록달록 활엽수들이 인상적이었다.

 미시간대학교도 미식축구의 명문. 2018년 경기관람 당일 전광판에 110,549명의 관중수가 찍혔다.
미시간대학교도 미식축구의 명문. 2018년 경기관람 당일 전광판에 110,549명의 관중수가 찍혔다.
Raphael 교수 랩에서 기존에 주로 Guinea pig 난청 모델에서 adenovirus를 사용하여 유모세포의 마스터 유전자인 Atoh1을 주입하는 기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유류 성체에서도 유모세포가 재생될 수 있음을 밝혔지만 그 효율이 낮은 문제가 있었기에 이를 높일 방법을 연구 테마로 받았습니다. 또한 Transgenic 모델을 활용하여 더 확실한 난청을 유발시키고 돌연변이에서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니픽 대신 마우스를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달팽이관에 adenovirus를 통한 유전자 전달을 위해서는 Scala Media로 주사를 해야 하는데 마우스의 경우 총 volume이 200nl (0.2ul)로 매우 작습니다. Nanoinjector를 사용하여 이 작은 공간으로 바이러스를 주사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고 3개월만에 첫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는데 그 때가 연말 무렵으로 모두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다양한 유전자와 약물을 Atoh1과 복합투여 하여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Gfi1이라는 유전자를 같이 전달하였을 때 유모세포 재생율이 확연히 증가하고 이는 성체에서도 가능한 방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달팽이관으로 adenovirus 매개 외부 유전자 전달 촉진 방법과 유모세포가 파괴된 이후 생체내 clearance mechanism에 관한 프로젝트도 맞게 되어 바빠졌지만 재미 있게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미시간대학교 병원 및 생명과학 관련 학과에 한국 출신 교수들이 20여명 있었는데 우연히 한분 교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소개로 한달에 한번씩 한국인 스텝 모임에 참석해서 한국말로 담소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두 10년 이상 전에 미국으로 건너와 열심히 연구하고 꿋꿋하게 살아온 모습이 귀감이 되었고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랩에 있는 동안 중국 베이징 통륀병원, 일본 도쿄 게이오대학병원에서 연수 온 이비인후과 교수들이 있었는데 연배도 비슷하여 함께 실험하고 각국의 병원 사정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얻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모여 한식, 중식, 일식당을 번갈아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좌측은 2018년 크리스마스파티에서 Raphael교수와 부인(미시간대학교병원 소아과 과장).
우측은 2019년 시내 중식당에서 같은 랩 소속 한국, 중국, 일본 3국 모임.
아쉬웠던 점은 미시간이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이 정말 춥고 눈이 많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있었던 2018년 겨울이 30년만에 기록적인 강추위로 공립학교도 10회 정도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미시간대학 자체도 2일 정도 폐쇄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듬해 5월까지도 눈이 내렸습니다. 쾌적한 2019년 여름을 잘 보내고 나니 금방 다시 겨울이 찾아옵니다. 다행이 두번째 해의 겨울은 비교적 온화한 편이었는데 살만하다고 생각되던 와중, 2020년 2월, 난데없이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코로나가 급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정말 고생하시는 모습에 안타까움과 멀리서 도움이 못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3월이 되니 미국에서 코로나가 폭증하고 급기야 3월말에 미시간에 Lock-down이 내려집니다. 실험실도 폐쇄되고 2달반동안 집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해보고 싶은 실험들이 많았지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그동안 결과를 정리해서 논문 작성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락다운이 풀리고 실험을 재개했지만 귀국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연수를 다녀오신 선생님들 모두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 이글을 쓰고 있는 현재도 코로나는 진행형이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연수를 연기하거나 어렵게 준비하고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루 속히 치료 및 예방법이 효과를 보기를 기원합니다.


좌측은 2019년 겨울 출근길에 연구센터 입구.
우측은 2020년 미시간 락다운 후 집에서 지내며 아이들과 동네 돌면서 운동 중.
미국의 연구실 생활을 통해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입니다. 대부분의 교수, 테크니션, 랩매니저 등이 모두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20-30년이상 동일한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과학 강국의 밑거름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연수를 허락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해주신 Yehoash Raphael교수님 및 실험실 멤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국 후 병원에 복귀하니 정말 일들이 많음을 느낍니다. 연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임상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연수기간동안 정년을 하셨지만 이비인후과 연구를 처음 가르쳐 주신 조용범 교수님, 그리고 이과 파트 은사님이신 장철호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없는 동안 청각 및 신경이과 연구실을 돌보고 연구에 매진해 오신 조형호 교수님 및 실험실 식구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수하고 있던 2년 동안에도 정말 고생하셨을 모든 병원 식구들께 경의를 표하며 심심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