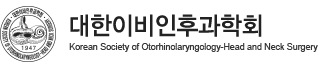미국에서의 research fellow 및 연구 문화
 0
University of Michigan 김성균
0
University of Michigan 김성균

안녕하세요. 저는 University of Michigan의 이비인후과 내에 있는 Kresge Hearing Research Institute에서 postdoctoral research fellow로 근무 중입니다. 약 8년간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이과 환자 진료 및 수술을 하다가 2023년 2월에 University of Michigan으로 연수를 오게 되었습니다. Kresge Hearing Research Institute는 한국의 많은 교수님, 연구자분들의 Kresge 동문회 네트워크가 있을 만큼 많은 분들께서 연수 오시는 곳입니다. 저는 연수 중인 곳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지속하고, 일부의 시간은 임상 관련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익숙했던 한국에서의 생활들을 잠시나마 정리하고,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University of Michigan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Michigan 주의 Ann Arbor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곳에 올 때 미시간이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서 지도를 보며 주변에 어떤 도시들이 있나 한참을 검색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시간은 펜실베니아 서쪽, 오하이오의 북쪽, 일리노이의 동쪽에 위치한 곳이며, 캐나다 온타리오 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Ann Arbor는 미국의 대표적인 College Town 중 하나이며, 작지만 학생들로 항상 북적이며 젊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매년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 2위에 소개될 만큼 치안이 좋고, 중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부, 서부보다는 물가도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Ann Arbor는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 도시 중 하나로 공립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고, University of Michigan과 연계된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은 곳입니다. 미시간의 대표 도시인 디트로이트는 미국의 4대 스포츠인 야구, 농구, 풋볼, 아이스하키 팀이 모두 있어서 각종 스포츠를 즐겨보는 저에게는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University of Michigan의 풋볼팀은 미국 대학 풋볼 리그에서 매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강팀이며 football stadium인 Big House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 (1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입니다. Ann Arbor의 인구가 11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이보다 더 많은 좌석이 있는 경기장이 있다니 참 놀라웠습니다.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홈경기가 있는 주말이면 조용했던 도시가 축제 분위기로 변하며 모두가 미시간 로고가 달린 티셔츠와 점퍼를 입고 경기장, 펍, 친구, 동료들의 집 등에서 경기 수시간 전부터 모여 파티를 하고, 경기를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오대호의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10월 말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여 4월 말까지 영하의 기온이 지속되는 혹독한 겨울은 아직도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동, 서부 도시들에 비해 한국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정착하기 쉽지 않았고, 한국 음식, 식재료들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 드리고, 임상 의사가 아닌 연구자로서 짧은 시간이나마 경험 중인 미국에서의 연구실 생활을 통해 미국에서의 연구는 한국과 어떤 부분들이 비슷하고, 다른 점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연수지를 정할 때 물가, 치안, 아이들 교육과 같은 요인들을 생각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연구를 하는 곳을 가보고 싶었는데, 그중 한 가지 주제가 central auditory processing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께 추천도 받아보고, 제가 직접 이메일도 보내 보면서 현재 있는 연구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연구실의 PI는 Jun Hee Kim 교수님으로, 오랜 기간 동안 auditory brainstem의 pre/post synaptic electrophysiology에 대해 연구하고 계시며,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at San Antonio에서 근무하시다가 2023년부터 University of Michigan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연수 오기 전 몇 번의 미팅을 통해 진행 중인 연구 주제들을 간략히 소개해 주셨고 연수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보고 배우고 싶은지도 말씀드리면서,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central auditory pathway에서 나타나는 소견들이 peripheral auditory pathway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었고, 감사하게도 제가 가진 경험들과 지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autistic spectrum disorder와 같은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Alzheimer’s disease와 같은 neurodegenerative diseases를 모사한 마우스 모델에서의 central auditory signal processing에 대한 몇 가지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마우스 ABR, DPOAE, brainstem, cochlea 조직의 면역 형광 염색, 행동 분석 등 많은 기초 연구실에서 하는 실험들도 하지만 patch clamp로 ion channel의 excitatory, inhibitory current의 변화를 확인하여 synaptic plasticity, myelin plasticity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중순부터는 미국 국방부 연구 과제를 시작하게 되면서 blast induced hearing loss 모델에서 auditory brainstem의 cell population 변화와 neuroprotective pathway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저는 blast project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coustic startle reflex, pre-pulse inhibition, gap detection test와 같은 방법들로 hearing threshold, tinnitus 발생을 확인하고, brainstem의 cochlea nucleus, medial nucleus of trapezoid body에서의 glial cell population, neuronal cell의 degeneration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central auditory pathway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랩 미팅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는데 점차 이해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랩 멤버들과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미국의 연구실에서 생활하며 느끼게 된 장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연구와 관련된 궁금한 점들은 학부 학생, 박사 학생, 박사 후 연구원, 교수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서로 편하게 질문하며 배우고, 또는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수가 학생에게 궁금한 점들에 대한 의견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가령 학부 학생의 사소한 질문이라고 해도 최대한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답변해 주려고 하며, 이런 대화들을 통해 때로는 좀처럼 진행되기 어려웠던 연구가 순항하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불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수평적인 문화 속에서 자란 미국 사람들의 장점 중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하고 뜬금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연구 주제들을 발표하고 논의하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말씀드릴 연구비에 대한 부분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연구실 생활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연구 센터 내에 auditory neuroscience를 연구하는 멤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주제이지만 논문으로 1-2개 정도만 발표된 토픽들, 예를 들면 cerebellum과 listening effort 또는 auditory cortex의 volume과 REM sleep disorder의 관계 등과 같은 주제를 한 가지 정해놓고 박사 후 연구원이나, 박사과정 학생들이 이런 연구가 실현 가능한지 본인의 scientific opinion을 10-20분 동안 발표하고, 모인 사람들이 open discussion을 1-2시간 동안 하고 마음에 맞는 멤버들이 모인다면 small group을 만들어, preliminary study를 3-4개월간 진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주제들은 지속 가능성이 매우 적고, trainee들의 과학적 사고방식을 훈련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 중 하나이지만 때로는 참석한 누구에게는 본인의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academic institute의 목적은 수준 높은 연구도 있지만 그보다 trainee 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모두가 공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9월부터 6월까지 10개월 동안 매주 있는 Hearing, Balance and Chemical Senses Seminars에는 관련 연구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자들이 각 학교, 산업체 등에서 방문하여 강의하면서 청중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데,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유익하고 저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미나 이후에는 trainee 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하며, 강의 내용에 대해 토론을 이어 가기도 하고, 때로는 각자의 진로를 상담하기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도 이 시간들을 통해 많은 석학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유익한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어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구실의 문화와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후에는 조금 더 PI의 입장에서 연구비를 수주할 수 있는 방식과 과정이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변함없는 사실은 연구 주제가 누가 봐도 참신하고, 사전 연구 결과가 연구 계획과 잘 연결되어 있다면 연구비를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습니다. 저도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이어 나가기 위해 PI 교수님과 함께 미국의 여러 관련 연구자들과 연락하며,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어떻게 하면 연구 계획서를 잘 써서 연구비를 얻어낼 수 있을지 항상 고민 중이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고 느꼈던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연구비를 수주할 수 있는 곳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주로 의과대학에 임용된 교수가 계획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수주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연구재단, 보건산업진흥원과 같은 국가 기관이 대부분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기관에서 기업과의 협업과제로 연구비를 수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도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과 같은 국가 기관에서 많은 부분의 연구 사업들을 주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Department of Defense (DoD)에서 다루는 연구 사업들의 비중이 높고 연구비의 규모도 매우 큰 편입니다. 미국은 군 의료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고, 또한 예비역들의 건강 문제 관련 예산이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연구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군 의료 관련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mental health, auditory processing의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권장하고, 예산 배정도 가장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또한 연구자들이 기업과의 협업을 원한다면, 협업할 수 있는 행정 절차 및 연구비 규모를 학교 측에서 기업과 소통하면서 협상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구비를 기부할 수 있는 기부자 또는 기부 단체들을 모아 놓고 자신의 연구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구비를 수주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부 문화가 대학 내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며, 한국도 다양한 곳으로부터 연구비를 수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PI가 아니더라도 연구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 박사 후 과정 연구원들을 위한 소규모 연구비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연구자들에 대한 기회인 경우가 많지만, 교내, 원내, 지자체, 학회 또는 각종 자선 단체 등에서 수시로 연구비 지원에 대한 공고를 올리며, 관심 있는 학생 또는 연구자들은 자신의 멘토와 함께 연구 주제와 방향에 대해 고민하면서 발표를 준비하며 크고 작은 연구비 수주 기회에 노출되며 성장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게 되는 연구비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고, 목표한 부분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료 보고서를 써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연구자들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을 기록하고 되새기면서, 다음 연구에서 오류를 줄여 나가며, 조금 더 큰 규모의 연구 사업에 지원할 준비를 하게 되고, 이는 나중에 자신이 PI가 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high-risk, high-return (HRHR)을 다루는 연구를 위한 연구비의 규모가 크고 (약 $1.25 - 5 million/project, NIH), 연구 기간이 비교적 긴 편 (5+[2] years, NIH)입니다. 이는 개인 연구의 경우이며, 집단 연구로 구성된 팀에게는 더욱 많은 연구비가 배정됩니다. DoD는 HRHR 카테고리에 있는 연구 사업은 기간에 상관없이 1년 내내 항상 연구 계획서를 모집하며, 수시로 심사하고 먼저 지원한 연구 과제들에게 예산이 모두 배정되면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 사업의 제목 그대로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연구였는지 철저한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되고, 선정되는 과제의 수도 적기 때문에 다른 연구 과제 지원보다 계획하고 있는 연구가 가지고 있는 위험과 이익에 대해 상세하게 발표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개월 전에 연구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HRHR 연구 규모에 대해 알게 되면서, 어떻게 각 국가, 민간 기관에서 확실치 않은 부분에 대해 이와 같이 funding을 많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었는데, 연자의 답변은 ‘수천 년 동안 역사를 거듭해온 다른 나라들이 장년기와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면, 미국은 건국된 지 아직 200-300년 남짓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성인 때보다 유년기, 청소년기에 틀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생각하고, 불확실한 것들에 흥미를 느꼈던 것처럼, 연구 문화에도 이런 청소년기와 같은 미국의 모습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였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 동안 경험한 부분에서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들이 미국에서 오랜 연구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연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다양하며, 본인이 많이 노력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은 한국과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연수 왔을 때는 한국에서의 바빴던 시간들을 조금 내려놓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보냈지만, 퇴사 후 미국에서 더 지내 보기로 결정한 다음부터는 모든 순간이 무한도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비인후과에서조차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기회라도 얻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보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별 고민 없이 흘러가는 대로 앞길을 정해왔던 것 같은데, 지난 2년 동안은 낯선 이국 땅에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많은 고민을 하며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먼저 길을 걸어온 선배님들로부터 진심 어린 조언도 들으며, 우선은 주어진 시간을 통해 재미있게 연구하면서 더욱 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 합니다.
 사진 1. University of Michigan의 캠퍼스 전경
사진 1. University of Michigan의 캠퍼스 전경
 사진2. International Society of Extracellular Vesicle 학회 발표 후 시애틀 스타벅스 1호점에서
사진2. International Society of Extracellular Vesicle 학회 발표 후 시애틀 스타벅스 1호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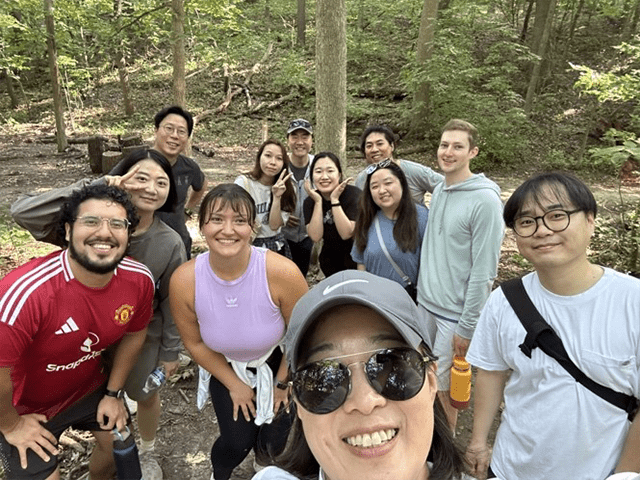 사진 3. 가을 하이킹
사진 3. 가을 하이킹
 사진4. 대학 풋볼 경기 관람
사진4. 대학 풋볼 경기 관람